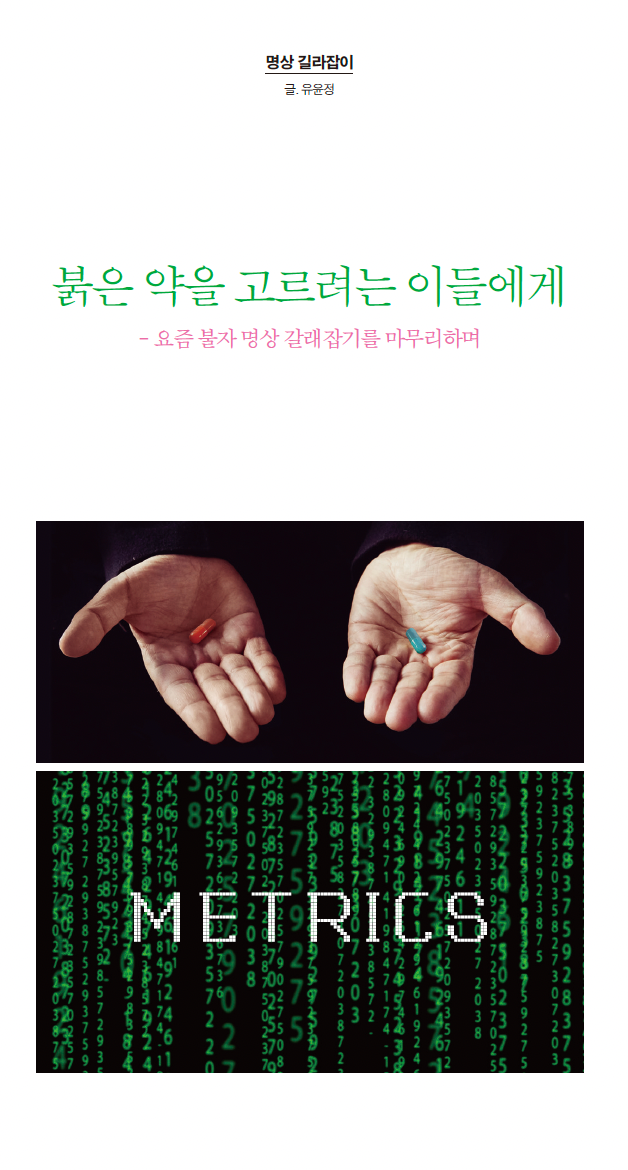고요히 머물고, 한 마음으로 부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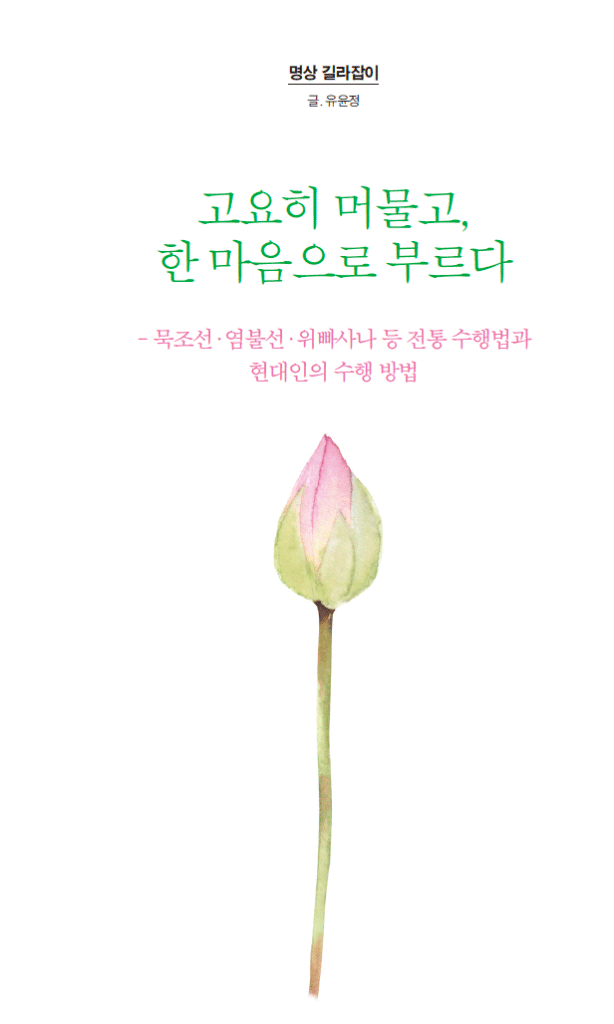
시간은 참 묘합니다. 어떤 날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흘러가듯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떤 날은 젖은 천처럼 무겁게 늘어져 도무지 흘러갈 줄을 모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해 살 때는 시간이 알차게 흐르지만 무심히 흘려보내면 한없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인공이 되어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 봅니다.
이번 여름 저는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눈에 담아가겠다”는 욕심에 정작 쉬지 못했고, 돌아오니 오히려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시선과 생각은 다음 일정으로 향했고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했지요. 몰입은 중요하지만, 목적과 방향을 잃으면 여행도 수행도 길을 헤매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수행이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잊지 않는 연습입니다. 걷는 길이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내가 세운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면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 수행의 방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 호에는 한국 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함께 이어져 온 묵조선(黙照禪)과 염불선(念佛禪), 초기 불교의 사마타(Samatha)와 위빠사나(Vipassanā), 그리고 현대 생활 속 명상까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수행의 길을 안내합니다.
고요 속에서 비추는 수행, 묵조선
묵조선은 ‘묵묵히 고요히 머물며(黙) 모든 것을 밝게 비춘다(照)’는 뜻의 수행입니다. 중국 송대에 조동종(曹洞宗)의 굉지정각 선사(宏智正覺, 1091~1157)가 체계화했으며, 화두를 붙잡아 의심을 일으키기보다 침묵 속에서 고요히 앉아 마음을 비추는 데 주력합니다.
이 수행은 ‘지관타좌(只管打坐)’, 뜻 그대로 ‘오로지 앉아있기’를 중시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지켜봅니다. 생각을 억누르지도, 붙잡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을 비추듯 마음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간화선이 화두를 통해 단박에 본질을 꿰뚫는 길이라면, 묵조선은 한 걸음씩 밟아 오르는 점진적 수행입니다.
이름 속에 깃든 믿음, 염불선
염불선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그 이름과 나를 하나로 하는 수행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등 한 구절에 마음을 모아, 부르는 소리와 내가 둘이 아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염불선 전통은 신라시대의 원효 대사(元曉, 617~686)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효 스님은 중생수행의 방편으로 염불을 권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하면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고려시대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선사는 ‘무념염불(無念念佛)’을 설하며, 아미타불 염불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하면 무념 속에서 염불 삼매에 들고, 그 속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 선사도 선과 교, 염불을 함께 닦는 방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근기를 포용했습니다.
근현대의 무주 청화(無住淸華, 1924~2003) 스님은 실상염불선(實相念佛禪)을 주창했습니다. 청화 스님은 자신의 불성을 믿고, 그 불성이 아미타불의 실상임을 관하는 것이 참된 염불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부처를 찾는 것은 복을 비는 방편일 뿐이며, 자기 안의 본성을 부처로 삼아 염하는 것이 참된 염불선이라 하였습니다.
염불선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다가도, 일하다가도,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심상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통찰, 사마타와 위빠사나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초기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사마타는 팔리어로 ‘고요·평온·생각의 그침’을 뜻하며,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해 번뇌를 가라앉히는 집중 수행(지법止法)입니다.
위빠사나는 ‘통찰·내관·직관’을 뜻하며, 모든 현상이 변하고(무상), 괴로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고), 변치 않는 자아가 없음(무아)을 깨닫게 하는 관찰 수행(관법觀法)입니다.
주로 사마타로 마음의 기반을 고요히 다지고, 위빠사나로 그 고요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통찰합니다. 이를 위해 ‘사념처(四念處)’-몸(身念處)·느낌(受念處)·마음(心念處)·법(法念處)-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립니다.
오늘날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통합수용치료(ACT), ‘마음챙김 명상’ 등 현대 심리치료와 결합해 폭넓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수행
명상은 누구나 일상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삶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명상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목받습니다.
아침에 차 한 잔, 저녁에 짧게 걷는 산책처럼 일상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는 작은 의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요가나 싱잉볼 명상처럼 감각을 열어주는 새로운 명상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 관심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템플스테이의 선명상 프로그램이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선명상은 한국 간화선 전통을 바탕으로 사마타·위빠사나 명상, 과학 기반 명상을 아울러 함께 경험하도록 설계된 현대형 수행입니다.
위에 소개한 수행법 외에도 주력(呪力, 진언 수행)·다라니, 절, 기도, 간경(看經), 사경(寫經) 등 전통 수행법들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행은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새벽에 눈을 떠 침대에 앉아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호흡을 관찰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염불로 마음을 다스리는 등, 일상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수행의 길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방법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선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이 수행의 뿌리이며, 하루하루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고요히 머물든, 명호를 부르든, 호흡을 지켜보든, 수행자로서 방향과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 첫 숨을 고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걸을지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햇살처럼 고요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