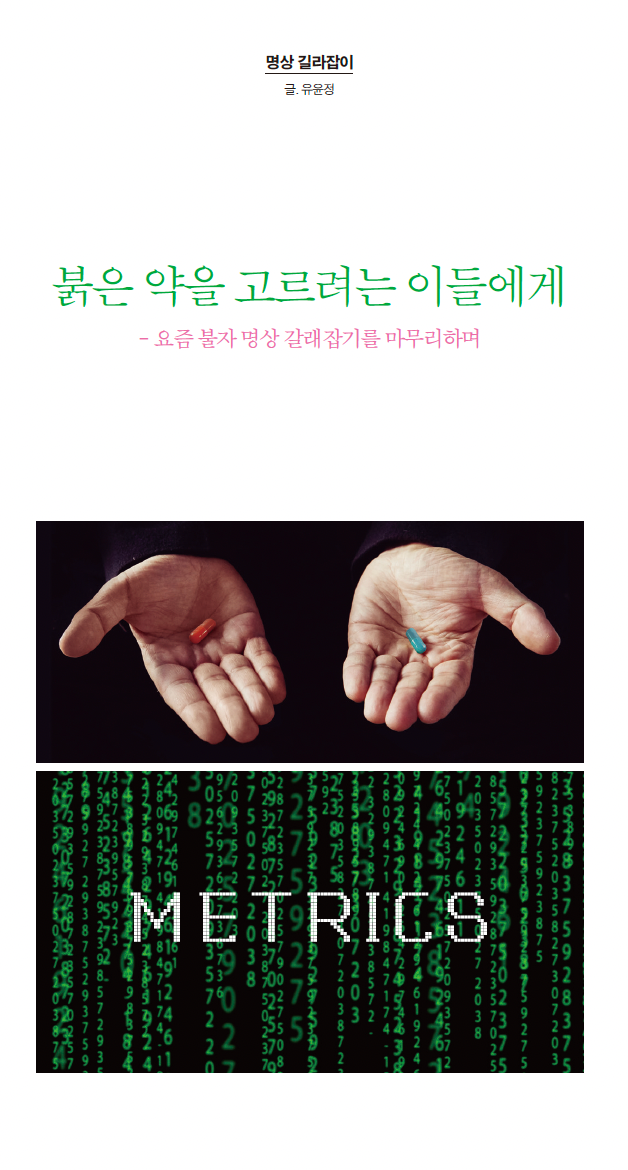실크로드를 따라 넘어온 불교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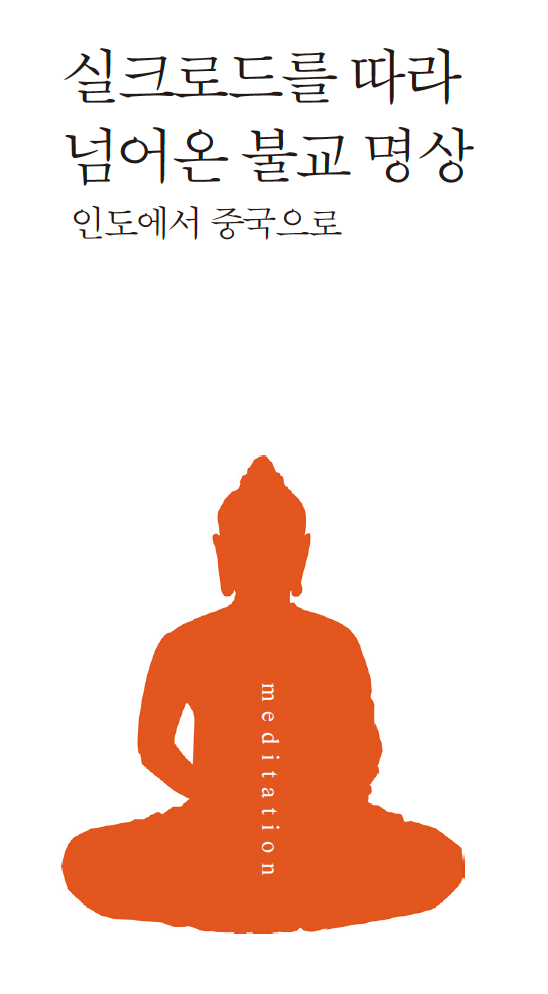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한 호흡 사이에 생과 사가 있습니다. 숨을 내쉰 후 다시 새로운 숨을 들이쉴 때, 그 순간을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바로 그 때가 새로운 나를 맞이하는 시간이 됩니다.
요즘 대중에게 명상이라고 알려진 방법들은 호흡이나 몸의 감각 등에 집중하는 훈련으로 괴로운 감각과 생각, 감정을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의 수행은 이러한 단편적 접근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집니다. 불자의 수행은 고통의 원인인 허상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고 욕망의 족쇄를 끊어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고통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데 목표를 둡니다.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나요? 불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걷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탈’에 목적지가 설정된 네비게이션, 지도가 주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비단길 따라 건너온 부처님 가르침
그런데 궁금합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가르침이 어떻게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은 실크로드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서역 각 지역의 문화 및 사상과 결합하며 더욱 발전합니다. 명상의 형식과 의미도 각 문화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훈련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수행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 전역에 널리 전파된 시기는 아소카 대왕(기원전 272~232경) 때입니다. 부처님 열반 후 200년 뒤 인물입니다. 아소카 대왕은 인도 역사에서 전역을 통일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왕으로, 불교에서는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도 불립니다. 불교를 적극 후원하며 사찰 건립과 경전 편찬을 지원했으며, 인근 국가에 포교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노력으로 불교는 인도 전역과 스리랑카 등 주변 지역으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진 시기는 부처님 열반 후 약 6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기원전 1세기~서기 2세기 초 쿠샨 제국의 카니슈카 왕의 지원 아래,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문명의 고속도로를 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카니슈카 왕은 대승불교를 중앙아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불교는 부처님 열반 후 여러 부파로 나뉘어 부파마다 교의를 각기 달리 해석하던 때였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확립하고자 학식이 깊은 스님 500명을 카슈미르에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제4차 불전 결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학술 연구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경장(經)과 율장(律), 논장(論)은 물론, 삼장三藏의 주석까지 모두 정리해 약 30만송으로 알려진 방대한 분량의 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나 주변 지역으로 더욱 확산되기 쉬워졌지요. 이 결집은 대승불교의 철학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 수행법
이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는 까닭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한역 불경이 후한 말 2세기 후반(약 148~170년경)에 서역과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온 안세고安世高 등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역경譯經된 경전들이 한반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법이 실린 경전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안세고는 초기 선경禪經인『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선행법상경禪行法想經』 등을 번역했습니다. ‘안반수의’는 아나빠나사띠Ānāpānasati라는 원어의 음차 번역으로, ‘들숨 날숨에 집중하는 수식관數息觀’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불교 수행법이지요. 『선행법상경』도 네 가지 법상法想 수행 등에 대한 수행법과 관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경전은 중국 선불교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전이기도 합니다. 4세기에는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년경)이 좌선 수행으로 삼매에 이르는 방법을 설하는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탄생과 발전
5세기 말~6세기 초, 남북조 시대에 보리달마菩提達磨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도착하면서 수행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선종禪宗의 등장입니다. 달마 대사는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로, 이후 선종 발전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선종은 교종敎宗에서 강조하는 언어적 해석이나 이론적 접근보다는 직접적인 수행 경험과 직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며, 내면의 본래 불성을 찾아 성불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을 핵심 교의로 삼았습니다.
초조달마 대사는 말이나 글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정신을 강조하며, 직관적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달마의 법맥은 사조도신(四祖道信, 580~651년, 선종 체계화의 시작) 선사와 오조홍인(五祖弘忍, 601∼674년, 선종 대중화) 선사를 거쳐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년) 선사로 이어졌습니다.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을 통해 돈오頓悟 사상을 완성했습니다.
이어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년) 선사는 ‘평상심이 도道’라 말하며 일상생활 속 수행을 강조했고요. 그 뒤를 이은 임제의현(臨濟義玄, ?~866년) 선사는 화두 참구법을 강조하며 임제종臨濟宗을 창시했습니다.
12세기 송나라에서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년) 선사가 임제종의 화두 참구를 중심으로 간화선看話禪을 체계화하고 ‘무無’ 화두를 집중 수행법으로 보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년) 선사는 고요히 앉아 본성을 비추는 묵조선默照禪을 주창했고, 이후 명나라 시기 감산덕청(憨山德清, 1546~1623년) 선사는 염불과 선 수행을 결합한 염불선念佛禪을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선종사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참선을 통해 자신의 본래 불성을 직관적으로 깨달음으로써,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직지인심直指人心과 견성성불見性成佛의 가르침입니다.
한국 불교의 독보적인 수행 시스템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은 중국 선종 불교의 맥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독창적인 요소를 발전시키며 독자적인 수행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중공동체 중심의 선원 등 한국불교의 수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수행되었던 간화선과 묵조선, 염불선 등의 수행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