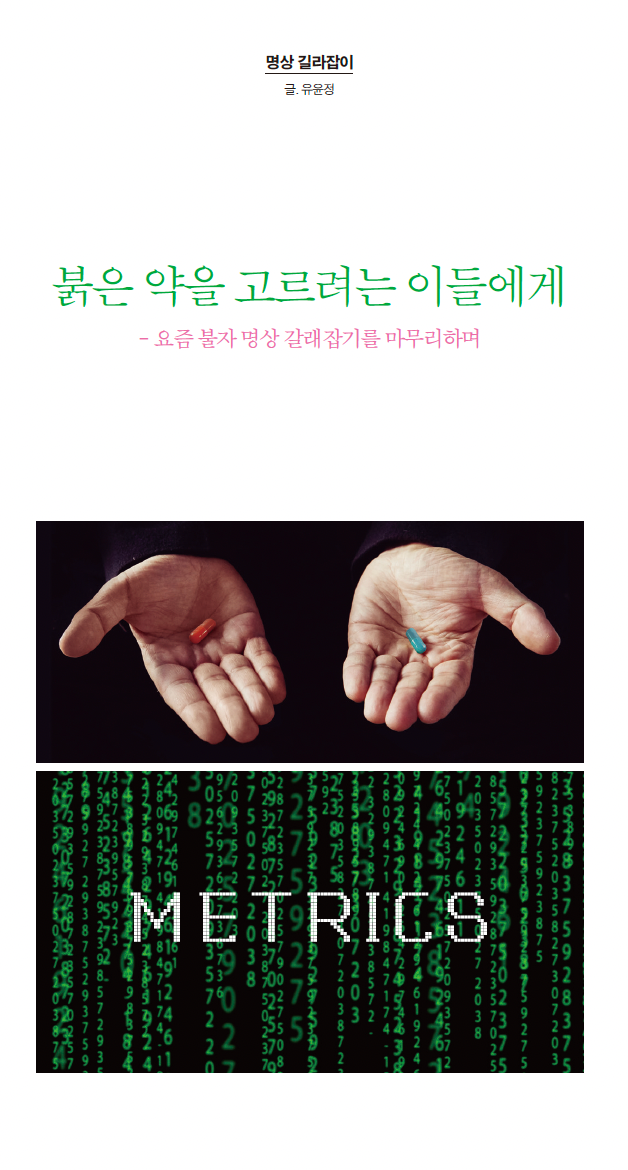의심하라, 나를 바꾸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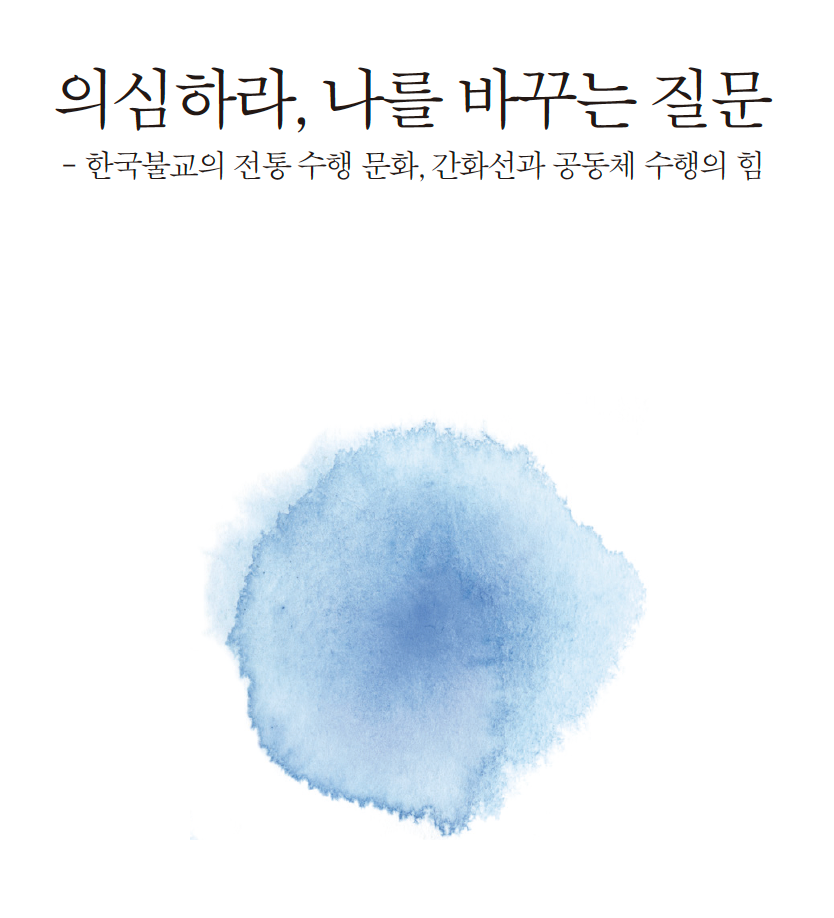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3일이면 다행입니다. 결심은 입에서 나오기 무섭게 무너지고, 어느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치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며 ‘난 안 될 놈이야.’ 하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습관은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보다 먼저 앞서 나가 삶의 주도권을 낚아채 버리곤 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수행을 꾸준히 하려면 먼저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을 깊이 새기고 익숙한 습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단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 더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주도권을 빼앗겨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좌절할 틈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습관이 진짜가 됩니다. 어쩌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이 꾸준함을 두고 생겨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행은 어떻게 습관을 바꾸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력한 습관의 힘을 이겨내고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화선은 특히 습관의 자동 반응을 깨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간화선은 ‘강렬한 의심’으로 익숙한 반응을 근본부터 흔들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입니다.
한국불교는 중국 선종禪宗의 맥을 잇되, 간화선 수행체계와 공동체 중심의 선원 문화를 발전시키며 독자적인 수행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미국 UCLA 명예교수 로버트 버스웰은 “한국불교의 독특한 매력은 간화선 중심의 엄격한 수행공동체 시스템에 있다”고 평가하며, “학문 전통과 수행 전통이 함께 살아 있다는 점 또한 한국불교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강조합니다.
참선과 교학, 수행[禪]과 학문[敎]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한국불교는 지금도 선방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며 간화선을 평생 정진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며 ‘작무作務’ 전통 속에서 노동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청소, 밭일, 장작 패기, 김장과 메주 쑤기까지 모든 일상과 울력을 수행의 연장으로 여겼습니다.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순간,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머무는 그 모든 순간, 즉,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이 곧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식善知識 스승과의 문답으로 바른 길을 찾고, 규율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며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간화선看話禪, 의심으로 여는 수행
간화선은 ‘화두話頭’라고 하는 의문문을 깊이 참구하며, 의심을 타파하고 그 본래 의미를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이뭣고?’ ‘무자화두無字話頭’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등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장은 간화선 수행자가 참구하는 대표적인 화두로, 약 1,700여 개의 공안公案 중에서 추출한 짧은 문장의 질문들입니다. 공안은 선문답 전체를 뜻하고, 그중 핵심 물음을 뽑아 만든 짧은 질문이 화두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절실한 물음과 닿아 있는 화두를 택하거나 스승이 내려준 질문을 깊이 참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간화선은 화두에서 비롯된 ‘의심’을 오직 한마음으로 붙들어 분별과 집착을 꿰뚫고 자기 본성을 직면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 의문이 뚫릴 때까지 의심을 놓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간화선이라는 가장 간절하고 치열한 수행의 길입니다.
의심이 수행이 되는 길
화두를 ‘의심하라’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에 대해 용성 스님(1864-1940)께서는 한글로 쓰인 최초 불교 교리서 『각해일륜覺海日輪』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중한 보배를 몸에 깊이 간직하여 애지중지하다가 갑자기 잃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늘 의심하며 보배를 어디에다 두었는가 하고 찾는 것과 같이 해라.”
즉, 수행자는 일상 속 모든 순간을 보배를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화두를 참구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화두를 잡을 적에 … 어떤 때는 찬 얼음같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순풍에 돛단배와 같이 술술 잘 되기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공부는 잘 되든지 못되든지, 좋고 언짢은 마음을 두지 말고, 다만 화두만 잡고 몰아가야 한다. 고요히 앉아서 맑은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취하여 공부를 삼지 말고, 말하고 움직이며, 고요히 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지도 말아야 한다. 또 생각을 허공같이 하든가 마음을 담벽과 같이하여 공부하지 말 것이니, … 다만 일심으로 이 한 물건, ‘무無’를 모르는 것만 의심하면 자연히 보고 듣는 경계가 고요하고, 물건과 나를 함께 잊어 산하대지가 없어지며 허공에 녹아지나니,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자연히 막힌 것이 뚫릴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시작하기
화두선은 깊은 집중으로 자아 해체를 요하는 수행으로 ‘최상승乘의 법’이라 불리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출가수행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재가자에게도 그 문이 점차 열리고 있습니다. 재가자를 대상으로 한 간화선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발전하는 불교답게 일부 선원에서는 간화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템플스테이 사찰들은 전통 수행법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선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재가자도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몇 차례 전했듯이 불교 명상은 단지 쉼이 아니라 나를 직면하고 삶의 본질을 통찰하는 가장 고요하고 치열한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안내하신 해탈에 이르는 길은 단순한 정신 안정만이 아니라, 존재와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습관을 직면하게 되고, 직면했기 때문에 그 행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공부가 수행을 돕고, 수행이 공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수행을 위해 스스로 세운 규칙과 규율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수행은 혼자 앉는 시간이면서도 함께 걷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반이 있기에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단 5분, 조용히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