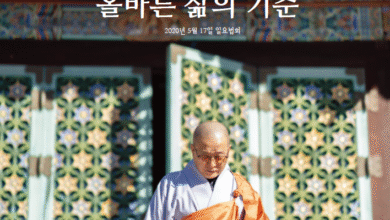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는가? – 윤회 1
2019.07.05 초사흘법회

삶은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 사라짐이니
뜬구름이 본래 실체가 없듯
삶과 죽음도 실체 없기는 마찬가지네
함허 득통 선사
생과 사는 마치 뜬구름 같아서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허망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게송입니다. 윤회는 결국 생과 사를 반복하는 것인데, 정의하자면 의식이 있는 것이 나고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돌이나 구름 같은 무정물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회를 불교의 고유한 사상, 불교만의 고유한 가르침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했을 당시 이미 인도사회에는 윤회라는 사상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사회를 지배하던 대표적인 종교는 바라문교(지금의 힌두교)였습니다. 그 외에 불교, 자이나교 등 대부분의 종교가 윤회를 기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다마 싯다르타라는 수행자도 윤회사상을 수용하고 당신 가르침의 기본적인 전제로 삼았습니다.
윤회는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윤회는 불교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인도 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인도사회의 지배적 종교였던 바라문교에서는 윤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겁니다. 바라문교에서는 첫 번째, 영혼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아트만(atman) 혹은 진아(眞我)라고 하는 변함없는, 영원한, 고정불변의 ‘나’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이 나라는 것이 윤회의 주체가 되고 업의 주체가 됩니다.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내가 악한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나쁜 몸을 받고 내가 착한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회와 비슷합니다. 업(業)은 요즘 말로 행동이고, 업에 의한 윤회와 그 윤회로부터의 해탈,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윤회와 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윤회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당시의 종교들은 모두 다 하고, 또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윤회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어서 좋은 몸 받았다가 나쁜 몸 받았다가 짐승의 몸을 받았다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바라문교의 윤회입니다.
부처님은 이 아트만을 부정했습니다. ‘아트만 같은 건 없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무아사상입니다. 고정불변의 실체나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할까?’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 대목부터 윤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윤회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고? 내가 없다고 하면 윤회도 부정을 해야지 윤회는 한다고 하면서 나는 없다고 그래. 이게 도대체 뭐야?’
부처님이 아트만을 부정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윤회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행위는 있으나 행위를 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빵을 훔쳤다고 하면 사회적인 약속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남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빵을 훔쳤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장발장>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빵 하나 살 돈도 제대로 벌 수 없는 사회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악업을 지었으니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문 서두에 경전 게송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독송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게송 구절이 여러분들 입으로 옮겨가서 소리가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게송이 내가 말할 때는 나한테 왔다가 여러분이 말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갔다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주체가 있어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용수 스님은 게송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이크에 대면 소리가 커집니까? 발전소에서 만든 열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전기에너지가 마이크로 와서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이 전기신호를 스피커로 보내면 증폭된 소리로 바뀝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엔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전기에너지로 모습을 바꾸어 전선을 타고 발전소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까지 이동하고, 이 전기에너지가 스피커로 가서는 증폭된 소리로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발전소에서 전기줄로 전기줄에서 마이크로 마이크에서 스피커로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없다면 에너지는 없는 것입니까?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편의상 ‘에너지’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에너지’라는 것의 활동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정작 ‘에너지’의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개념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요령을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누가 소리 냈습니까? 내가 소리 냈나요? 아닙니다. 요령을 흔드는 손은 내가 아니라 내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요령소리는 분명히 났습니다. 행위는 있는데 소리를 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스님이 손으로 흔드니 소리가 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손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도 분명히 소리는 났습니다. 행위는 있되 누가 소리를 냈는지의 그 ‘누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